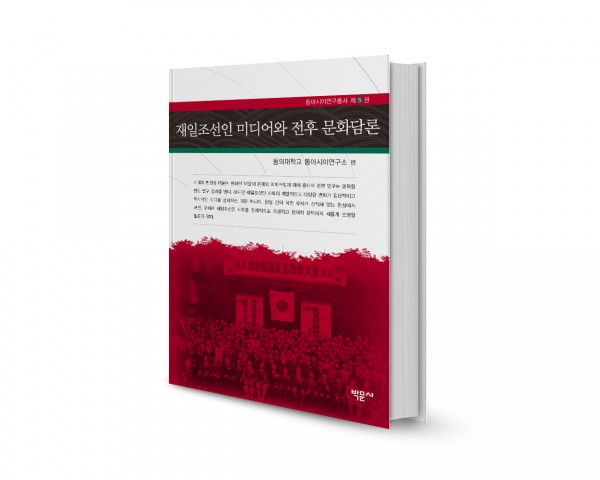[동아시아연구총서5]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EAS 작성일23-07-05 20:18 조회181회관련링크
본문
[동아시아연구총서5]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
박문사 · 2018년 06월 30일
현재 재일조선인 사회와 문화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된 ‘재일’의 존재와 의미규정에 대해 종래의 관련 연구는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사회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가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 간의 식민 유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보면, 오히려 재일조선인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현재적 문맥에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은 재일조선인 사회와 문화가 갖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적인 영역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기획한 연구서이다.
재일조선인 문제는 탈식민과 분단의 재일 70년을 지나면서 한일 관계사의 핵(核)으로 남아 있고, 그만큼 한일 관계사에서 이들 재일조선인사회가 갖는 의미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일조선인사회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점에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데올로 기를 주입해 부(負)의 이미지로 읽어온 기존의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화시키며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전쟁 직후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고, GHQ 점령기의 검열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프랑게문고의 자료 연구가 성과를 낸 것을 비롯해, 전후문화운동 연구도 활발해 관련 잡지의 복각이 이어지고 있다. 제국이 해체되고 냉전과 탈냉전을 지나온 현재, 전쟁의 ‘기록’과 ‘기억’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전후 일본의 연구 현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재일조선인 사회의 기록과 기억을 복원시켜, 전후 일본사회에 대항적인 문화로서 작동해온 마이너리티성을 발굴하고 재일조선인 사회의 문화담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상과 같이, 본서는 일본사회에 동화되기보다는 차이를 만들어가며 공존의 방식을 찾아온 재일조선인 사회와 문화가 변천되고 변용되어온 과정을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신문 잡지 미디어 및 문학,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서 살피고 있다. 특히, 재일조선인 관련 신문 잡지나 생활사적인 자료들은 미디어를 통해 기호화되고 구성되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유통되는 전후 일본의 재일조선인 사회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새로운 상호교류적인 대화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부 재일조선인 잡지 미디어와 전후의 문화담론
01 재일조선인 에스닉 잡지 연구 -1950년대를 중심으로
02 서클시지 『진달래』와 1950년대 재일조선인의 문화운동
03 재일 작가의 범죄학 서사 -정기간행물 『김희로공판대책위원회뉴스』를 중심으로
제2부 재일조선인 신문 미디어와 교육?문예
04 해방 직후 착종하는 재일조선인 미디어 -조선문화교육회와 「문교신문」을 중심으로
05 미군정기 재일조선인 신문 미디어의 담론
06 『조선민보』(1958년 1월~1959년 2월)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문학의 양상
제3부 다양화되는 기록과 기억의 재일조선인 문예
0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 분석
08 ‘망명자문학’으로서의 『화산도』
09 이양지의 「돌의 소리」에 나타난 ‘모국’의 의미
10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영화문화